한 번의 살인으로는 끝나지 않는 사람들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또다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살인을 반복하는 걸까요?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연쇄살인범.
그들의 심리 구조를 파헤치면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본능과 마주하게 됩니다.
연쇄살인범, 인간 내면의 공백
연쇄살인범(Serial Killer)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적 쾌감, 통제욕, 자기중심성이라는 극단적 심리 구조에 의해 살인을 반복하는 범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심리학의 최신 연구 기준에 따라 연쇄살인범의 심리 구조와 그들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목차
1. 연쇄살인범이란 무엇인가?
2.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징
3. 연쇄살인을 반복하는 심리 메커니즘
4. 실제 연쇄살인범 심리 사례
5. 범죄심리학적 경고 – 연쇄살인범의 위험성
1. 연쇄살인범이란 무엇인가?
정의
FBI의 최신 기준에 따르면, 연쇄살인(Serial Murder)은 두 명 이상의 피해자를 별개의 사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행 간 일정한 ‘냉각기’가 있으며, 살인의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우 연쇄살인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는 연쇄살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각 사건 발생 사이에 일정 기간의 냉각기가 있는 범죄"로 연쇄살인을 정의합니다.
또한, 한국의 연구자들은 연쇄살인을 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 쾌락형 연쇄살인: 성적 욕구, 지배욕구 등 비가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
- 이득추구형 연쇄살인: 금품 강취 등 가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
- 분노형 연쇄살인: 일반 살인의 반복 형태로, 분노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
일반 살인범과의 차이점
| 구분 | 일반 살인범 | 연쇄 살인범 |
| 동기 | 충동, 분노, 개인적 감정 | 심리적 쾌락, 통제욕구, 내면 충동 |
| 범행 횟수 | 1회성 | 반복적, 지속적 |
| 범행 간격 | 없음 | 냉각기 존재 |
| 심리 구조 | 일시적 감정 폭발 | 장기적 심리 왜곡, 통제욕구 |

2.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징
연쇄살인범은 단순한 충동적 살인범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에서는 수십 년간의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범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주요 심리 특징
① 공감 능력 결여 (Empathy Deficit)
연쇄살인범의 핵심 특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인간이라는 인식이 희미하거나,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적 배경
- 반사회성 인격장애(ASPD),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깊은 관련
-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객관적 정보로만 인식하거나, 감정적으로 무감각
실제 사례
테드 번디, 이춘재 등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체포 후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전혀 보이지 않음
② 극단적 통제 욕구 (Control Desire)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위를 통해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심리학적 배경
- 어린 시절 통제 상실 경험, 권력 없는 삶에 대한 보상 심리와 연관
- 범행 과정을 게임처럼 계획하고, 피해자의 삶과 죽음을 자신이 결정하며 심리적 쾌감을 얻음
실제 사례
제프리 다머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시신 훼손, 보관, 식인까지 진행 → 극단적 통제욕의 표출
③ 충동 조절 실패 (Impulse Control Failure)
연쇄살인범은 처음 살인 후 자신의 내면에 쾌락, 흥분, 긴장 완화 등의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배경
- 쾌락-충동 강화 메커니즘 → 첫 살인의 심리적 쾌감 → 도파민 시스템 활성화 → 충동성 증가
- 스트레스 상황에서 범행 욕구가 폭발하는 경우 다수
실제 사례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범행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이 붕괴되는 패턴을 보임 (이춘재도 범행 초기보다 후기에 범행 주기 급격히 짧아짐)
④ 자기중심적 사고와 도덕적 왜곡 (Egocentric Thinking & Moral Disengagement)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도덕, 법,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사고 구조를 가집니다.
심리학적 배경
- 자기애적 성향 + 반사회성 성향이 결합
- 자신의 행위를 "특별한 존재로서의 권리"로 합리화
- 피해자를 물건, 대상화하여 죄책감을 최소화
⑤ 감정 둔화와 심리적 마비 (Affective Flattening)
초기 범행 시 긴장, 죄책감, 공포를 경험하더라도 범행이 반복될수록 감정적 저항선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심리학적 배경
- 반복적 살인 → 도덕적 감각 둔화
- 살인을 일상적 행위처럼 인식
-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인식 소멸 → ‘대상화’ 심화
실제 사례
이춘재는 검거 후 "살인을 반복하다 보니 별 감정이 없었다"고 진술
⑥ 사회적 위장 능력 (Social Masking)
연쇄살인범 대부분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매너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적 배경
- 사이코패스적 위장 능력(Social Masking) 발달
-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됨
-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외적 이미지 철저히 관리
실제 사례
테드 번디는 법대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정치 캠페인 참여자로 알려져 있었음 → 범행 전까지 주변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음
심리 구조 요약
| 심리 특성 | 내용 |
| 공감 능력 결여 | 피해자 고통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없음 |
| 통제 욕구 | 살인으로 타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심리적 쾌락 |
| 충동 조절 실패 | 살인 충동 통제 불가, 범행 반복 |
| 자기중심적 사고 | 도덕적 규범 무시, 피해자 대상화 |
| 감정 둔화 | 범행 반복 → 죄책감, 긴장감 마비 |
| 사회적 위장 | 겉으로는 정상적, 매력적 이미지 유지 |

3. 연쇄살인을 반복하는 심리 메커니즘
연쇄살인범이 한 번의 살인으로 끝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충동적 성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범죄심리학에서는 살인 경험이 개인 내면에서 특정 심리적·신경학적 보상 구조로 연결되며, 심리적 중독과 통제욕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주요 심리 메커니즘
① 쾌락 강화 → 심리적 보상 시스템 (Reward System Activation)
연쇄살인범은 첫 번째 살인 당시 경험한 심리적 쾌감과 통제감을 내면에서 강렬한 쾌락 자극으로 저장합니다.
심리학적 배경
- 살인을 통해 강한 흥분, 긴장 완화, 통제감을 경험
- 해당 경험이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
- 이후 스트레스, 불안 상황에서 살인 충동이 재활성화됨
실제 연구
미국 범죄심리학 연구에서는 반복적 범죄자일수록 범행 후 심리적 보상(흥분, 만족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도덕적 경계 붕괴 → 심리적 마비 (Moral Disengagement & Emotional Numbing)
살인을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존재하던 죄책감, 두려움, 긴장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이를 감정 둔화(Affective Flattening)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적 배경
- 초범 시 내적 도덕적 저항선이 작동
- 반복될수록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둔화 → 죄책감, 공포감 소멸
- 피해자를 ‘대상화’ 하여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됨
실제 사례
이춘재는 검거 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진술
③ 자기 정체성의 왜곡 → ‘살인자 서사’ 구축 (Narrative Identity Distortion)
연쇄살인범은 반복된 범행을 통해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살인 자체를 자신의 존재 이유, 권력의 상징으로 내면화합니다.
심리학적 배경
-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성향과 연계
- 범행을 통해 → 세상 위에 군림하는 통제자라는 서사를 구축
- 범행 자체가 삶의 목적, 자존감의 원천으로 변질
실제 사례
테드 번디는 수감 중 "나는 세상과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살인을 자기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
④ 외부 자극 → 충동적 촉발 요인 (Trigger Mechanism)
연쇄살인범의 범행은 대부분 내적 심리 메커니즘 + 외부 환경적 자극이 결합되어 촉발됩니다.
주요 촉발 요인
- 개인적 스트레스 (실직, 이별, 관계 단절 등)
- 피해자 유형과의 심리적 연관성
- 언론 보도, 수사 상황 등 외부 자극
특징
- 범행 사이에 냉각기(Cooling-off Period)가 존재
-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발적으로 재범행
학계 내 논쟁: ‘살인 중독(Homicidal Addiction)’ 개념
일부 범죄심리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반복 범행을 행동 중독(Behavioral Addiction)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모든 연쇄살인범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범죄심리학계 내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심리 메커니즘 요약
| 심리 매커니즘 | 내용 |
| 쾌락 보상 | 첫 범행의 쾌감 → 도파민 시스템 자극 → 재범 욕구 강화 |
| 도덕 경계 붕괴 | 반복 범행 → 죄책감, 공포, 긴장감 둔화 |
| 정체성 왜곡 | 살인 자체를 자기 존재 의미,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 |
| 외부 자극 | 스트레스, 분노 등 외부 자극이 범행 재개 촉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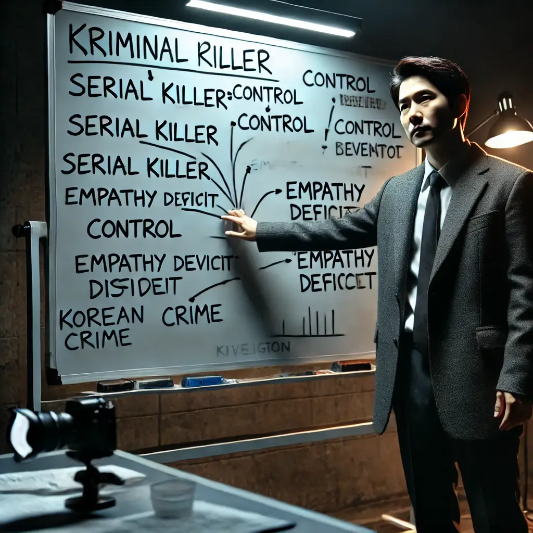
4. 실제 연쇄살인범 심리 사례
국내 사례 –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
사건 개요
- 1986~1991년,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최소 10명의 여성 살해
- 사건 발생 후 3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19년 DNA 증거로 이춘재 검거
심리적 특징
- 검거 후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음
-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자극이 되면 충동이 올라왔다” 등 자기중심적·공감 능력 결여된 진술
- 피해자를 철저히 ‘대상화’하고 살인을 통해 쾌락과 긴장 완화를 경험했다고 진술
범죄심리학 평가
→ 충동 조절 실패 + 감정 둔화 + 통제 욕구 전형적 사례
해외 사례 – 테드 번디 (Ted Bundy)
사건 개요
- 1974~1978년 미국 전역에서 30명 이상의 여성 살해
- 매력적 외모, 지적 이미지로 사회적 위장
- 자백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언급하며, 죄책감 없음
심리적 특징
- 사이코패스적 성향 매우 강함
- 피해자에게 접근 시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사용 → 통제욕 만족
- 범행 후 시신을 일정 시간 소유하거나 훼손 → 통제욕 지속
- 수감 중 인터뷰에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
범죄심리학 평가
→ 사회적 위장 능력 + 통제 욕구 + 도덕적 경계 붕괴 대표 사례
해외 사례 – 제프리 다머 (Jeffrey Dahmer)
사건 개요
- 1978~1991년, 17명의 남성을 살해 및 시신 훼손, 식인 행위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장기적 관계를 맺고 싶어했다고 진술
심리적 특징
-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 결핍 →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소유하려는 욕구
- 살인 후 시신을 훼손·보관·식인 등으로 극단적 통제욕구 충족
- 범행 후에도 죄책감 없음, 피해자에 대한 공감 결여
범죄심리학 평가
→ 통제욕구 + 자기애적 서사 구축 + 감정 마비 극단적 사례
기타 국내 사례 – 강호순
사건 개요
- 2006~2008년, 10명의 여성을 연쇄 살해
- 검거 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반성 없음
심리적 특징
- 피해자를 일회용 ‘대상’으로 인식
-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 유지 → 사회적 위장 능력
- 자백 과정에서 감정 표현 거의 없음
범죄심리학 평가
→ 자기중심성 + 감정 둔화 + 사회적 위장 능력 확인
5. 범죄심리학적 경고 – 연쇄살인범의 위험성
연쇄살인범의 심리는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충동이 아닙니다.
범죄심리학에서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성으로 평가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① 자발적 중단 가능성 ‘거의 없음’
연쇄살인범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신의 의지로 살인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적 이유
- 살인을 통해 쾌락, 통제감, 자기 정체성 강화 → 행위 자체가 내면 보상 구조로 자리잡음
- 범행을 지속할수록 심리적 저항선 붕괴 → 죄책감, 공포감 소멸 → 재범 가능성 극대화
실제 연구
미국 범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의 범행 지속성은 내적 도덕 경계선 붕괴와 밀접한 관련
② 사회적 위장 → 탐지 어려움
연쇄살인범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평범하거나 매력적인 사회적 가면(Social Mask)을 쓰고 생활합니다.
위험성 구조
- 이웃, 친구, 가족, 동료로 위장 가능
- 범죄 발생 전까지 주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음
- 범죄 발생 후에도 사회적 이미지를 통해 수사망 회피
실제 사례
테드 번디, 강호순 모두 평범한 사회 구성원, 친절한 이웃, 가족적 이미지로 위장 → 범행 기간 장기화
③ 범행 규모 확대 가능성
연쇄살인범은 범행을 반복할수록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고, 범행 규모와 잔혹성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적 배경
- 초기 범행 → 긴장감, 죄책감 존재
- 반복될수록 감정 둔화 → 살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 소멸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수, 방법, 범위 확장
실제 사례
이춘재의 경우 초기 범행 간격은 몇 달이었지만, 후반기에는 1개월 내외로 단축 범행 수법도 점점 대담하고 잔혹해짐
④ 사회·심리적 피해 확산
연쇄살인범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 심리적 충격과 불안, 범죄 모방 심리까지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 피해 범주 | 내용 |
| 직접 피해 |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신체적 피해 |
| 사회적 피해 | 지역 사회 불안, 공포 분위기 확산 |
| 심리적 피해 | 언론 과잉 노출 → 공포 확산, 모방 범죄 유발 |
실제 사례
화성 연쇄살인사건, 강호순 사건 발생 당시 지역 사회 공포 확산 → 여성 외출 자제, 사회적 경계심 극대화
⑤ 교정 가능성 극히 낮음
연쇄살인범은 범죄 후 체포되더라도 반성, 죄책감, 교정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심리학적 배경
- 대부분 반사회성 인격장애(ASPD), 사이코패스적 성향 동반
-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공감 회로 자체가 결핍
- 교정, 상담, 수감 이후에도 범행 충동 소멸 어려움
실제 연구
범죄심리학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할수록 재범률 2~3배 이상 높다는 통계 확인
범죄심리학적 최종 경고
연쇄살인범의 심리 구조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나 충동이 아닌, 쾌락, 통제욕, 도덕 경계 붕괴, 사회적 위장이라는 다층적 심리 위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적 개입과 제지 없이는 범행은 계속될 뿐입니다.
요약 – 연쇄살인범 심리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정의 | 두 명 이상의 피해자를 별개의 사건에서 살해하고, 범행 간 냉각기가 존재하는 범죄자 (FBI 기준) |
| 국내 기준 | 한국은 법적 정의 없음. 학계에서는 다수 피해자 + 냉각기 + 반복적 살인으로 정의 |
| 주요 심리 특성 | 공감 능력 결여, 통제욕구, 충동 조절 실패, 자기중심성, 감정 둔화, 사회적 위장 |
| 반복 범행 원인 | 쾌락 보상 시스템 활성화, 도덕 경계 붕괴, 자기 정체성 왜곡, 외부 자극에 따른 촉발 |
| 사회적 위험성 | 자발적 중단 가능성 거의 없음, 위장 가능성, 범행 규모 확장, 사회적·심리적 피해 확산, 교정 가능성 낮음 |
| 범죄심리학적 시사점 | 단순 범죄 성향이 아닌, 구조적 심리 위험 요소 → 조기 탐지와 사회적 대응 필요 |
연쇄살인범의 심리, 사회를 향한 심리학적 경고
연쇄살인범의 심리는 단순히 흉악한 범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쾌락과 통제욕, 도덕 경계의 붕괴라는 심리적 구조적 문제를 통해 살인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범행이 일체화된 그들에게 살인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삶의 일부,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범죄심리학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연쇄살인범의 심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경계심과 심리학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위험성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우리가 그 심리를 이해하고, 경계하고, 예방하지 않는 한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5.04.03 - [심리학] - 살인범의 심리 – 평범한 사람은 왜 살인을 저지를까?
살인범의 심리 – 평범한 사람은 왜 살인을 저지를까?
살인은 특별한 사람만 저지를까?뉴스 속 살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저 사람은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 아닐까?”하지만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누구나 특정 조건과 심
psychology-money.com
2025.04.03 - [심리학] - 사이코패스 vs 소시오패스 vs 나르시시스트 - 범죄심리학으로 구분하기
사이코패스 vs 소시오패스 vs 나르시시스트 - 범죄심리학으로 구분하기
당신 곁에도 '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저 사람, 혹시 사이코패스 아냐?""저건 소시오패스지, 공감 능력이 없어 보여.""나르시시스트 같아, 자기밖에 몰라." 뉴스나 SNS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세
psychology-money.com
'심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범죄심리학으로 본 위험한 성격 유형 TOP 5 – 가까이하면 안 되는 사람들 (0) | 2025.04.05 |
|---|---|
| 범죄심리학으로 본 살인의 전조 신호 10가지 – 당신 주변의 위험인물은? (0) | 2025.04.05 |
| 사이코패스 테스트 – 당신 주변의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20가지 질문 (0) | 2025.04.05 |
| 범죄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 - 하이브리스토필리아(Hybristophilia)의 모든 것 (0) | 2025.04.04 |
| 살인범의 심리 – 평범한 사람은 왜 살인을 저지를까? (0) | 2025.04.04 |



